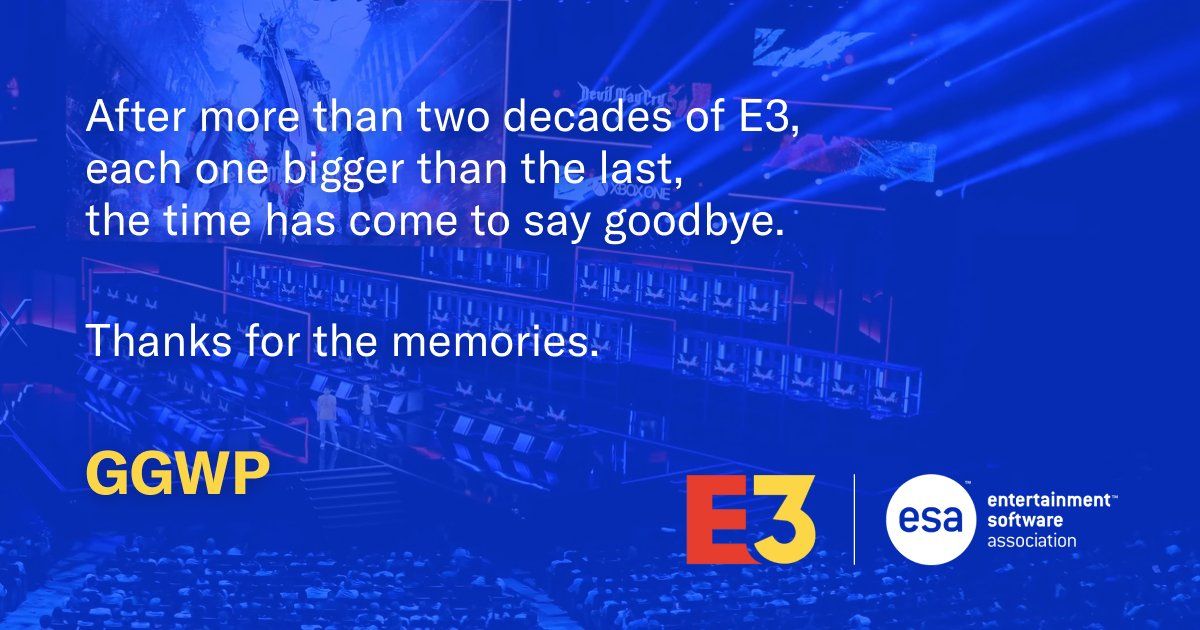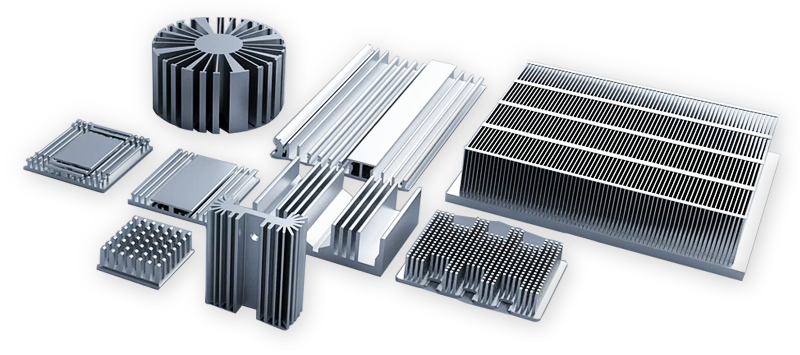E3 폐지, 놀랍지만 한편으론 당연했다

지난 12월에 전해진 E3 폐지 소식과 관련해 E3와 관련된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와 E3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두 차례의 기사를 통해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E3가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화려했던 무대 이면에 어떤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관련기사 : [추억속의 E3, 종언을 고하다(1부)] 보러 가기
관련기사 : [E3의 탄생과 발전(2부)] 보러 가기
세 줄 요약
-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며 오프라인 B2B 이벤트의 필요성이 감소
- 산업으로 발달하며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효율성이 강조
- 코로나로 인해 E3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칠 기회마저 박탈
내재됐던 폭발의 불씨
CES의 부진, 플레이스테이션과 새턴의 경쟁 등 풍부한 게임계 이슈, 당시 시장 상황상 판매 촉진을 위한 메가 쇼가 필요했던 상황이 맞물리면서 E3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E3를 성장시켰던 원인은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첫 번째 비수는 바뀐 미디어 환경이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앞서 설명한 것처럼 E3가 탄생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미디어 환경의 주축은 인쇄 미디어였다. 게임사는 인쇄 미디어를 통해 게임을 알리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게임 정보를 습득하며 구매에 활용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게임 미디어 환경은 인쇄 방식에서 웹 서비스로 무게추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다.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미디어 역시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인쇄 방식보다 웹 서비스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E3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다(2017년부터 소비자도 입장할 수 있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5~6월에 한자리에 모이는 인쇄 미디어를 통해 게임을 공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방식은 한 축인 인쇄 미디어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웹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게임사는 5~6월에 맞춰 막대한 돈을 들여(AAA급 게임사는 E3 3일 행사에 1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한다) 게임의 시연 버전을 미리 준비하고 홍보 자료를 만드는 등 일정에 쫓길 필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웹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E3의 위상이 워낙 큰 만큼 아예 불참하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E3에 몰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게임사의 이런 움직임은 2010년대 중반부터 E3에 직접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닌텐도는 이전부터 E3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지만, 그래도 E3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독자적인 쇼케이스를 열어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하는 등 분위기를 고무시키는 역할은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쇼케이스조차 열지 않았고 자사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방송인 ‘닌텐도 다이렉트(Nintendo Direct)’로 쇼케이스를 갈음했다. EA도 이때 쇼케이스를 열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를 통해 자사의 신작 게임을 소개했다.
2019년의 소니 불참 선언은 치명타였다. 1995년 ‘299달러’ 선언으로 E3 정착에 크게 공헌한 소니가 24년 만에 불참을 선언한 건 E3의 현 위상을 상징하는 큰 이슈였다. 소니는 닌텐도 다이렉트와 비슷한 성격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State of Play)’를 2019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산업’으로의 발달이 가져온 역설
과거 침침한 조명 아래 불량학생들이 침 뱉으며 담배 피우던 ‘전자오락실’의 연장선 취급받던 게임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거대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산업’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일견 산업으로의 발달로 인해 덕을 볼 것 같은 E3는 점점 그 입지를 위협받는 역설과 맞닥뜨리게 된다. 두 번째 비수는 산업화였다.
산업으로 발달하기 위해선 대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부의 마니아만 즐기던 문화에서 가정마다 즐기는 취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스미디어 노출이 필요해진다. 다행히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판을 깔기 위한 자본이 충분하다.
앞서 설명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게임이 산업화하면서 게임사는 기존의 메가 쇼, 인쇄 미디어 의존 비중을 줄이고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판을 깔아 놓은, 매스미디어 노출의 비중을 높여 간다.
정해진 시기, 특정 방법(인쇄 미디어)을 통해서만 게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TV에서, 쇼핑몰 전광판에서, 길거리 간판에서 쉽게 게임 소식을 접한다. 자연스럽게 E3와 같은 메가 쇼에 대한 흥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E3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줄어드니 게임사는 E3에 대한 투자(?)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 E3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바로 돈이다. E3가 가장 흥행했던 시기인 2005년에 E3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비용으로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회사가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전시 규모와 현장 홍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신들의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회사들의 경쟁은 비용으로 이어지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웹 미디어의 발달과 매스미디어 노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서 업계 관계자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메가 쇼의 필요성에 의문은 더해진다.
개발자들은 바쁜 개발 일정 속에서 E3에서 시연할 게임 버전(일종의 체험판)까지 만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온라인 패치를 통한 버그 수정이 가능하지 않았던 당시에 한창 마무리 작업을 매진해야 했던 개발진은 E3만을 위한 시연 버전 제작에 시달려야 했다. 당연히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진 인쇄 미디어 노출을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어 메가 쇼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문이 생겼고, 적은 돈을 들여도 자신들의 게임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아낀 돈을 이용하면 매스미디어 노출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바보가 아니라면 답은 뻔했다. 누가 봐도 E3는 위기였다.

변화의 시도마저 빼앗아버린 코로나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최근 ‘한국판 CES’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현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속내는 접어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그만큼 대단한 위상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67년에 시작한 CES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ICT(정보 통신 기술)가 전자제품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CES의 주최자인 소비자 가전 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가 소비자 기술 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가전’보다 ‘기술’에 무게를 두며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E3의 주최자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원래 B2B를 위한 행사였던 E3가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되면서 참여사의 과다한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생기자 참여 인원을 2007년에는 1만 명, 2008년에는 5천 명으로 제한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행사로 돌아가려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9년부터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다(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했던 참여사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017년에는 B2C 행사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시도됐다. 행사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관람객용 입장권을 15,000명에게 판매한 것이다. 하지만 입장권 자체도 싼 가격이 아니었고(일반권은 250달러, 얼리 버드 구매 시 150달러),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 시기로 인해 치솟는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갔다. 게다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도 현장에서 게임 시연을 체험하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미디어나 업계 관계자용 체험대는 별도로 운영됐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졌다.
E3가 살아남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 악재가 더해졌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그리고 이는 곧장 치명타로 이어진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야외 이벤트가 중단된 2020년, 2021년은 어쩌면 E3로서는 마지막 기회였을 터였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뭔가 시도는 해볼 수 있던 시기다. 그러나 2년간 모든 이벤트가 중단됐고, 그동안 많은 게임사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게이머와 소통했다. 점차 비중을 늘려가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ESD)은 패키지 판매량을 뛰어넘으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 E3처럼 B2B 형식의 메가 쇼는 더는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E3와 함께 세계 3대 게임쇼라 불리는, 하지만 B2C 대상의 게임스컴과 도쿄 게임쇼는 2022년부터 오프라인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E3는 2022년에도 열리지 못했으며 2023년에도 개최가 취소됐다. 그리고 2023년 12월, 공식적으로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처럼,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고 했다. E3의 폐지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게임 관련 이벤트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