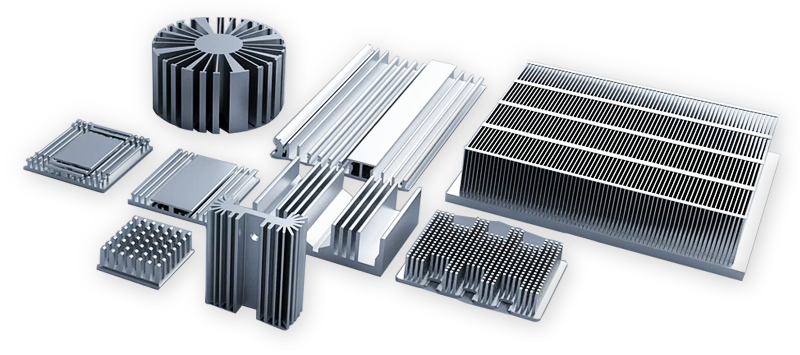추억 속의 E3, 종언을 고하다

지난 12월 12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세계 최대의 게임쇼라 불리며 28년째를 맞은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었다.
E3는 필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그리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게임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벤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E3에 얽힌 추억도 큰 편이라 비록 조금 늦었어도 관련 기사를 준비해 보았다.
설마가 현실로, 결국 찾아온 폐지의 수순
공식적으로는 2023년에 폐지가 발표됐지만, 사실 E3는 인공 호흡 장치 덕분에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뇌사 환자처럼 위중한 상태였다. 2008년 일어난 세계금융위기에서도 건재함을 자랑했지만, 2019년 개최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이다.
2020년, 2021년이야(2020년은 온라인으로만 개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같은 세계 3대 게임쇼라 불리는 도쿄게임쇼와 게임스컴이 2022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했다는 점을 보면 분명 E3는 뭔가 이상했다. 2023년 6월에는 Insider Gaming이 ‘미국 LA 관광청(LA Tourism Board)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E3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E3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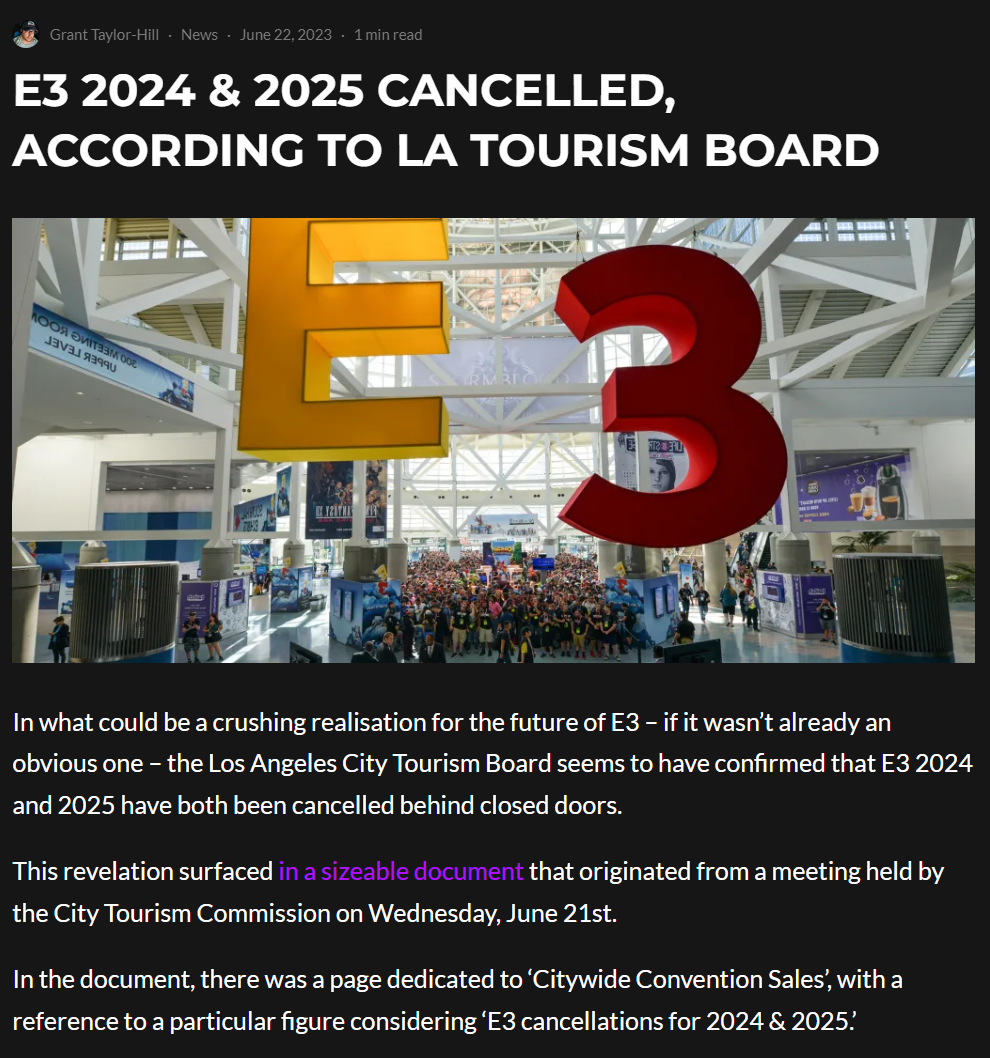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2023년 9월에 E3를 주최해온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와 LA 컨벤션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E3의 위기는 공식화됐다. ‘매년 6월 LA 컨벤션 센터에서 E3가 열린다.’라는 불문율이 깨졌기 때문이다(2006년까지는 5월에 열렸고, 특수한 상황이었던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그 후로는 모두 6월에 열렸다).
E3 같은 대형 행사를 개최할만한 전시장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그리고 그런 전시장의 대관 일정은 수년 전부터 빽빽하게 차 있다. 다른 대체 전시장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전시장과의 계약을 종료했다는 건, 그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더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12월 12일,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진짜’ 해외 취재의 고생스러움을 깨닫다
필자가 E3에 처음 취재차 방문한 건 2004년이다. 도쿄게임쇼를 취재한 적은 몇 번 있지만, 그때는 월간지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현지 취재 시에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기사로 쓸 소스(영상, 사진, 팸플릿, 브로슈어 등)만 꼼꼼하게 챙겨오면, 기사는 월간지 마감 전까지만 작성하면 됐기에 현지에서는 말 그대로 ‘취재’에만 전념하면 됐다. 행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동료 기자들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새로 공개된 게임 이야기를 꽃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웹진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이전과는 양상이 달랐다. 낮에는 취재하고 저녁에는 주요 기사를 썼으며, 밤에는 낮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용량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다. 미국 LA는 한국과 17시간 시차가 있기에 한국에서는 한창 열심히 일할 낯~저녁이기 때문이다.

E3 취재는 준비 과정부터 복잡했다. 그리고 준비 과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가 IT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됐던 인터넷 강국이었다. 1998년에 인터넷 이용자 310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 14만 가구가 2001년에는 이용자 2,438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 781만 가구를 기록했을 정도였다(자료 출처 : 컴퓨터월드 2002년 9월호).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당시 미국의 인터넷 보급 현황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LA 번화가에 자리한 비즈니스 호텔(당시 1박당 100달러 정도)의 인터넷 속도가 20Kbps 내외였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PC방의 전송 속도는 30~40Kbps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광대역 인터넷 속도가 200Kbps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송 속도가 한국의 1/7~1/10에 불과했다.
사진과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사진, 영상의 크기를 작게 조절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또한, 당시의 비디오 카메라는 디지털 파일로 기록되는 형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테이프에 기록되는 방식이라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였다. 이 기능은 고가의 노트북에만 탑재되는 ‘고급’ 기능이었기에 회사에서 쓰는 취재용 노트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캡처 보드’라 불리는 별도의 옵션 장치가 필요했다. 당연히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용 노트북에 맞는 캡처 보드를 미리 구매해서 테스트한 후 가져가야 했다.

이렇게 정신없는 저녁~밤 시간을 더욱 바쁘게 만든 건 메이저 개발사들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였다. 아무래도 E3가 일반 관람객은 입장할 수 없는 업계 관계자들의 행사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이벤트를 여는 곳이 이즈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녁 시간에 별도의 행사를 열고 게임을 공개했는데, Xbox의 메가 히트 작품 ‘Halo’의 후속작 출시일이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필자는 출시일이 공개되며 광란의 열기에 휩싸인 행사장에서 잠시 나와 한국의 동료 기자에게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헤일로 2 출시일 발표, 11월 9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해외 로밍 문자 전송 요금은 약 2,000원이었다.

2004년 E3에서 필자의 일정
- ①낮에는 E3 행사장 취재
- ②간단하게 저녁 식사 후 한인타운 PC방으로 이동
- ③노트북 캡처 보드로 비디오 카메라의 중요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
- ④PC방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사이징 후 한국으로 전송
- ⑤전송되길 기다리며 기사 작성
- ⑥5~6시쯤 숙소로 돌아와 잠깐 취침 후 씻고 다시 행사장으로 출발
3일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더니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2004년에는 화장실도 안 가고, 기내식도 못 먹고 돌아오는 내내 잠만 잤다(다음 해인 2005년에는 그래도 좀 익숙해졌는지 화장실과 기내식은 챙겼다). 하지만 이렇게 밤잠을 줄이며 고생하고 올린 사진과 영상을 본 한국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싸움질하는 댓글 창을 보면(그때도 플빠, 엑빠, 닌빠는 건재했다) 힘이 솟았다. 간혹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올라온 것을 칭찬하는 글을 보면 짜릿했다. 아마 이 맛에 게임 기자를 하는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깨우쳐준 게 E3였다.